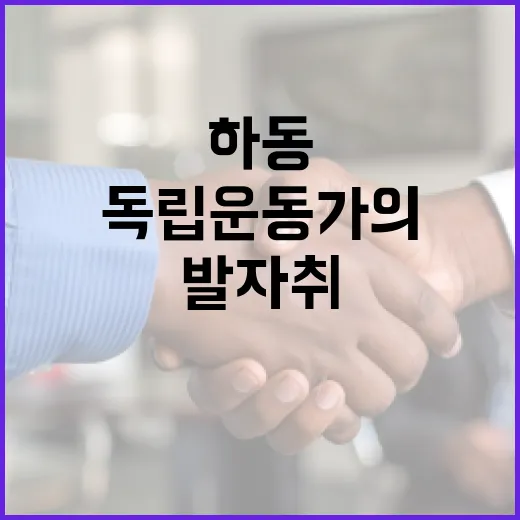하동 父子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발자취

하동 출신 독립운동가 김홍권·김병성의 삶
경남 하동군 양보면 출신의 김홍권 지사와 그의 아들 김병성 지사는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부자(父子)다. 이들의 숭고한 뜻과 희생은 후손과 지역사회에 깊은 울림을 남기고 있다.
민화 화실에 걸린 독립운동가의 사진
사천시 사천읍에 위치한 민화 전문 화실에는 김홍권 지사의 흑백 사진이 방문객의 눈높이에 맞춰 걸려 있다. 손녀인 민화가 김성숙 씨가 조부에 대한 자부심으로 걸어둔 이 사진은, 거뭇한 콧수염과 하얀 한복 깃을 입은 젊은 청년 김홍권 지사의 아련한 눈빛을 담고 있다. 1919년과 2025년을 잇는 시간의 다리를 통해 그의 숭고한 정신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상징한다.
아버지 김병성 지사와의 뜻깊은 만남
김성숙 씨는 1997년 진주시 칠암동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향토사학자 추경화 선생 주최의 ‘충효사진전시회’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던 아버지 김병성 지사의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설명에는 할아버지 김홍권의 이름이 적혀 있었으나, 김 씨는 자신과 닮은 아버지를 즉시 알아보았다. 이로 인해 김성숙 씨는 두 독립운동가의 유족임이 알려졌고, 그간 수령자가 없던 김홍권 지사의 건국훈장도 받을 수 있었다.
독립운동에 바친 집안의 희생
김홍권 지사는 1892년 하동군 양보면 운암리에서 태어나 1909년 대동청년단에 가입해 국권 회복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1919년 상하이 임시정부에 참여해 임시의정원 의원과 재무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경상남도 지역의 구급의연금 모집 책임위원을 맡았다. 당시 집안이 소유한 수만 평의 땅을 소작인들에게 매도해 독립운동 자금으로 바쳤다. 이후 만주와 국내를 오가며 군자금 모집과 독립운동을 지속했다.
아버지 김병성 지사의 독립운동
김병성 지사는 1910년생으로, 아버지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중앙청년동맹과 고려공산청년회 활동을 통해 항일투쟁에 참여했으며, 치안법 위반으로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1935년에도 체포되어 고초를 겪었으며, 일제는 그를 공산주의 사상가로 기록해 독립운동가로 인정받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독립운동가 부자의 유산과 후손의 다짐
김홍권 지사는 1937년 46세로 세상을 떠났으며, 정부는 1963년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고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으로 훈격을 승급했다. 김병성 지사는 1947년 38세의 나이로 별세했으며, 2022년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되었다. 손녀 김성숙 씨는 두 분의 치열한 삶을 떠올리며 깊은 감동과 존경을 표했다.
독립운동가 가족의 삶과 기억
김성숙 씨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으나 어머니를 통해 독립운동가로서의 삶을 전해 들었다. 가족보다 조국을 우선시한 조부와 부친의 삶은 후손들에게 큰 자부심이자 무거운 책임으로 남아 있다. 김 씨는 광복회 경남서부연합지회에서 20여 년간 활동하며 조부와 부친의 공적을 기리는 공훈비 건립과 서훈 수령에 힘썼다.
경남 출신 독립유공자 현황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경상남도 출신 독립유공자는 총 1476명으로 집계되었다. 창원 188명, 통영 111명, 함안 101명, 밀양 93명, 합천 89명, 하동 70명 등 지역별로 다양하다. 이들 독립유공자의 출신지는 광복 이전 행정구역 기준이며, 일부는 정확한 시군이 확인되지 않았다.
후손과 지역사회에 남긴 큰 뜻
김성숙 씨는 “조국을 위해 헌신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청춘과 희생에 머리가 숙여진다”며 “그분들의 뜻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후손으로서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하동의 독립운동가 부자는 오늘날까지도 지역사회와 후손들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전하고 있다.